조선시대에는 많은 왕세자가 있었지만, 끝내 왕이 되지 못하고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인물들도 많았다. 그중에서도 가장 불행한 운명을 맞이한 세자 10명을 선정하여 그들의 생애와 비극을 정리했습니다.
조선의 왕이 되지 못하고 죽은 불행한 세자 10명
조선에서 임금의 장자(長子)로 태어났지만 왕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불행한 삶을 마친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왕의 장남이 왕세자(王世子)가 되었음에도 왕위를 잇지 못한 까닭은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로도 전해지는데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된 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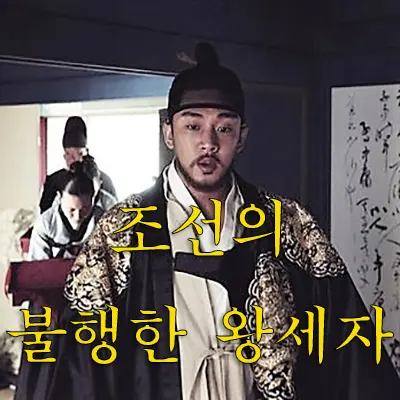
조선의 왕세자, 장자의 불행한 운명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고 새로운 도읍지에서 왕조를 건설하기로 마음먹고 국호를 개칭하기 전에 천도 이전부터 명한다. 그래서 지금의 세종시인 계룡도 알아보고 서대문 근처도 알아봤는데 결국에는 현재의 경복궁이 있는 곳에 왕궁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궁궐을 어디에 짓는가는 앞으로 조선의 역사에 있어 엄청난 비밀을 안고 가는 것이었다.
풍수지리에 따른 조선 왕세자의 비극
조선 후기의 문인 성현이 지은 『용재총화』를 보면 “개성은 산과 골짜기로 둘러싸여 막힌 형세라 권신들의 발호가 많았던 반면 한양은 북서쪽 우백호가 높고 남동쪽 좌청룡이 낮아 맏아들인 장자가 잘 되지 못하고 차남 이하 아들이 잘되어 오늘날까지 임금과 재상, 거경(巨卿. 높은 벼슬아치)은 장남 아닌 사람이 많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반증하듯 조선의 27명의 왕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장자가 왕위를 계승한 경우는 문종, 단종, 연산군, 인종, 현종, 숙종, 경종 등 불과 7명이다. 왕세자 27명 중 장자는 꼴랑 7명이라니 너무 적다. 일단 이성계의 맏아들이었던 이방우(진안대군)도 왕이 되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 이성계가 위화도회군를 일으키고 조선 왕조를 세우자 이에 반대하면서 강원도 철원으로 숨어버렸다. 이성계가 건국하자마자 다음 왕위를 누가 물려받는가 하는 중대한 문제는 첫 단추부터 꼬여버린 것이다. 결국 이방원의 제1차 ~ 2차 왕자의 난이라는 피바람으로 이어지면서 셋째 아들 이방이 정종에 오르고 이어서 이방원이 태종에 등극한다.
정도전의 설계는 왕위 무력화였을까
풍수에서는 좌청룡은 장남과 벼슬(官)을 그리고 우백호는 차남과 여자 그리고 부(富)를 관장한다고 본다. 조선 궁궐을 처음에 지을 때 만일 무학대사의 말대로 인왕산을 주산(北)으로 삼고 튼튼한 북악산을 좌청룡으로 삼았으면 정면으로 보이는 관악산(火山)의 화기(火氣)도 피하고 조선의 왕실은 장자 상속의 왕위가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도전이 주장에 따라서 북악산을 주산(北)으로 하고 산세가 약한 낙산을 좌청룡으로 하였기에 약한 청룡자락의 영향으로 결국 장남(長男)의 발복은 미약할 수 밖에 없었다는 풍수적 해석이 맞아 떨어진 것일 수 있다. 조선의 왕조 역사를 돌이켜보면 왕위 계승은 장자가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설령 장자상속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비극을 맞이하거나 또는 단명에 그치고 차남들이 왕위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찌 보면 정도전이 주장한대로 경복궁이 지어지면서 조선의 왕권은 장자들이 잇지 못하면서 사실상 신하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모습도 보인다. 조선의 왕들이 차남이나 삼남 또는 얼떨결에 왕의 자리를 받은 띨띨한 왕손들로 이어지면서 조선은 왕보다는 대신들이 짭짤하게 권세를 누리는 나라가 된 것이다.
조선의 불행한 세자 10명
- 양녕대군(讓寧大君, 1394~1462) – 폐세자의 운명
태종의 장자였던 양녕대군은 세자로 책봉되었으나, 학문보다는 놀고 즐기는 자세를 꿋꿋하게 유지하다가 태종의 신임을 잃었다. 결국 1418년(태종 18년) 세자에서 폐위되고, 동생 충녕대군(세종)이 세자로 책봉되었다. 그는 폐세자가 된 후에도 정치에 개입하려 했고, 이는 왕실과의 갈등을 유발했다. 결국 그는 왕위에서 밀려나 평생을 유랑하며 불운한 삶을 살았다. 평생을 놀다 죽은 왕의 장자이다.
- 소현세자(昭顯世子, 1612~1645) – 비운의 귀환
인조의 장자였던 소현세자는 병자호란(1636) 이후 청나라로 끌려가 8년간 볼모 생활을 했다. 그곳에서 그는 서구 문물을 접하고 개방적인 사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645년 조선으로 돌아왔으나, 청과의 관계를 중시하던 그의 태도는 아버지 인조와 충돌했다. 결국 귀국한 지 몇 달 만에 갑자기 사망했으며, 독살설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한다. 그의 부인 강씨와 자식들 또한 숙청당하는 비극을 겪었다.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사서 비극적인 삶을 마감한 인물이다.
- 효명세자(孝明世子, 1809~1830) – 왕이 되지 못한 대리청정자
순조의 아들로서 1827년부터 대리청정을 맡아 개혁을 시도했으나, 1830년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22세의 젊은 나이였으며,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그가 살아 왕위에 올랐다면 조선 후기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아들 헌종이 즉위했으나, 나이가 어려 다시 세도정치가 강화되었다.
- 사도세자(思悼世子, 1735~1762) – 뒤주에 갇혀 죽은 세자
영조의 아들인 사도세자는 정신적 불안정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아버지 영조의 미움을 샀다. 결국 1762년, 영조는 그를 뒤주에 가두고 8일 동안 굶겨서 죽였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그의 아들 정조는 훗날 왕이 되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려 했다.
- 의소세자(懿昭世子, 1750~1752) – 요절한 세자
영조의 손자로, 사도세자의 장남이자 정조의 형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영특하고 총명하여 기대를 모았으나, 불과 2세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조선에서 왕위 계승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그는 요절하면서 조선의 정치 구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 경평군(慶平君, 1427~1445) – 세자의 자리도, 삶도 잃은 비운의 왕자
세종의 장자이자 문종의 형이었던 그는 원래 세자가 아니었으나, 문종이 즉위 후 병약했기에 후계자로 거론되었다. 그러나 문종이 조기에 사망하고 단종이 즉위하면서 그는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결국 계유정난(1453) 이후 숙청당하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 폐세자(廢世子) 의경세자(懿敬世子, 1438~1457) – 왕이 될 수 없었던 세조의 아들
세조(수양대군)의 장남으로, 아버지가 쿠데타(계유정난)를 일으켜 왕이 되었지만, 의경세자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이후 동생 예종이 왕위에 올랐으나, 예종마저 요절하면서 그의 아들 성종이 즉위하였다. 그는 왕이 될 기회가 있었으나 병약함으로 인해 꿈을 이루지 못한 비운의 인물이었다.
- 신성군(信城君, 1551~1592) – 폐세자의 비극
명종의 조카로, 선조가 즉위하면서 왕위 계승권을 잃고 왕실에서 소외되었다. 이후 임진왜란(1592) 때 왜군에게 피살되었다. 그의 삶은 조선 왕실의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인물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 원손(元孫) 정제(定齊, 1688~1690) – 장희빈의 아들, 사라진 왕위 계승자
숙종과 장희빈의 아들로, 1688년 원자로 책봉되었으나, 인현왕후가 복권되면서 그의 지위는 불안정해졌다. 결국 1690년 불과 3세의 나이로 급사하였으며, 독살설이 강하게 제기도 되었다. 만약 그가 살아 있었다면 숙종 이후 왕위 계승 구도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 이정(李婷, ?~1457) – 단종의 세자,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비운의 후계자
단종의 아들로 추정되지만, 문헌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1457년 단종이 죽을 때 그의 아들도 함께 숙청된 것으로 보이며,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만약 그가 살아남아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다면 조선 왕실의 계보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조선의 왕세자로 태어났지만 비극적 운명으로 끝나다
왕세자로 책봉되었거나 왕위 계승자로 거론되었지만, 정치적 음모나 유배, 폐위, 또는 의문의 죽음 등으로 인해 왕이 되지 못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다는 것은 조선 왕실의 권력 다툼과 정치적 숙청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들이기도 하다. 왕세자로 태어나면 무엇을 하나? 왕이 되지도 못한 왕세자들은 차라리 평범하게 살다 간 민초(民草)들보다 못한 불행한 삶의 소유자였다.
상식은 권력이다 nBox.com
